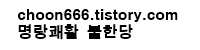국가 산업 발전은 경공업 -> 중공업 -> 첨단 산업 순서로 간다고 배웠다.
그리고 경공업의 대표적인 예로 봉제업을 든다.
한국도 가난했던 시절에 봉제업으로 시작했고, 이제는 인건비가 싼 동남아 저개발 국가로 이전했다.
그래서 봉제업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만만하지 않다.
그저 저임금 노동력만 풍부하다고 봉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와 치안이 갖춰져야 한다.
국가 산업이 발전하려면 자재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항만 인프라가 필수다.
옷은 어느 상황이든 누구에게든 유용한 물건이라 현금화가 쉽다.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와 도구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난과 강탈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치안 역시 중요하다.
한국이 못살긴 했지만 '경제 수준에 비해' 치안이 놀라울 정도로 양호했고, 국토가 작다 보니 인프라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어디까지나 경제 수준에 비해서 도난 사건이 적은 편이었지, 딱히 한국인이 정직의 유전자를 타고난 건 아니다.)
한국 봉제기업들이 동남아로 진출 초기에 각종 부자재와 도구 도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완제품 옷은 물론 원단, 단추, 바늘, 실, 심지어는 미싱에 부착하는 보빈(단추 크기의 실패)까지 매일 몇 개 몇십 개 씩 없어졌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각 조별로 도구들을 반납하고 일일이 갯수를 세어서 검사했다고 한다.
한밤 중이나 연휴 때 원단을 담 너머로 넘겨 훔쳐가는 도난 사고가 흔했다.
이런 도난 사건은 뜨내기 도둑의 소행이 아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과 회사 경비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인근 마을 주민이라는 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의 일가친척이라는 뜻이다.
그야말로 현지인은 안팎으로 모두 도둑놈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동남아 다음으로 봉제업이 옮겨갈 만한 나라로 아프리카를 꼽는데 그리 만만하지 않다.
일단 치안과 인프라가 헬 난이도고, 그나마 괜찮은 지역은 인건비가 절대 싸지 않다.
유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권이나 노동법에 관한 인식도 높다.
유럽 국가들이 가까운 아프리카 놔두고 아직도 중국이나 동남아, 남미에서 의류를 수입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이 달갑지 않다는 이유도 있고.
첨단 산업, 중공업에 비해 경공업인 봉제업을 쉽게 보는 인식은 착각이다.
산업 발달 수준이 높은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봉제업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임금을 어지간히 많이 주지 않는다면 인력을 수급하는 것부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 되지 않겠나 싶겠지만, 봉제업은 '인력 집약 산업'이다.
경공업이든 중공업이든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어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